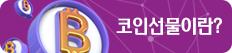[기자수첩]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이 주는 경고
 코투선
0
4
2025.05.20 13:49
코투선
0
4
2025.05.20 13:49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했다. 지난 16일(현지시간)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미국의 신용등급을 'Aaa'에서 'Aa1'로 한 단계 낮췄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 가운데 미국 등급을 강등한 건 지난 2023년 8월 피치 이후 1년 9개월만이다.
무디스는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하락에 대해 국가부채 증가와 재정관리 한계를 사유로 들었다.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미국의 국가부채는 약 36조2200억달러(한화 약 5경520조)에 이른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은 지난해 123%까지 치솟았다.
미국은 지난 2001년 이후 매년 재정적자를 이어왔고, 특히 2019~2021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정부지출을 50% 이상 늘리면서 국가채무 규모가 급증했다. 미국은 향후 10년간 국가부채가 2조5000억달러 이상 불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
|
이정아 경제부 기자 |
그러나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은 미국에만 국한된 건 아니다. 12·3 계엄사태 이후 3대 국제신용평사가는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을 리스크 요인으로 지목했지만, 현재는 '국가채무'를 공통되게 가리키고 있다.
제레미 주크 피치 아시아·태평양 국가신용등급 담당 이사는 "피치는 한국의 장기적인 재정수지가 어떻게 변화하느냐가 고려사항"이라고 밝혔다. 한마디로 국가채무의 증가속도가 향후 한국의 신용등급 가늠자가 된다는 것이다.
문제는 한국의 대응 여력이다.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지난해 기준 1175조2000억원으로, GDP 대비 비율은 46.1%다. 정부는 올해 국가채무가 12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6·3 조기대선 이후 2차 추경이 예상되면서 국가채무 증가 폭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가신용등급은 경제 성적표의 최상단이자 국제시장이 바라보는 국정관리 능력의 척도다. 신용등급이 하락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국채금리가 상승하면 정부의 이자부담이 늘고, 이는 다시 국가채무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진다.
경제 대국이라고 불리는 미국마저 신용등급 하락을 피해 가지 못했다. 신용등급 강등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다. 정치적 대립과 재정의 정치화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우리 신용등급은 안전하다'는 낙관은 위험하다.
신용을 쌓는데는 긴 시간이 걸리지만 무너지는 건 한 순간이다. 지금이 그 출발점이 되지 않도록 미국의 사례를 교훈 삼아 국제 신용평가사들의 경고를 받아들이는 성찰이 필요하다.